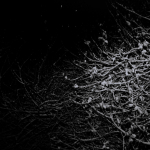'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스러운 세계가 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빛나고, 가장 끔찍한 날로 상처 입은 그 세계는 다른 이들에게 결코 열리지 않는다.' 정희진의 낯선 사이 칼럼에 소개된 독일 신학자의 구절입니다. 어쩌면 소통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길이 열리나 봅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권력관계의 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하와 위계,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면 대화는 설 자리를 없어지겠죠. '힘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게 대화는 필요 없다.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소통은 '명령과 복종'이라는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 힘의 논리 앞에서 대화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집에서 사회에서 길에서 모임에서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에서 검둥이 한 녀석을 만났습니다. 비닐로 덮여 있는 어수선한 마당입니다. 강아지의 엉덩이에 모터라도 달린 듯 쉴 새 없이 흔드는 작은 꼬리가 정겹습니다. 발길을 멈추고 교감하려 했으나, 흐릿한 비닐 한 장이 대화를 차단해 버립니다. 결국 강아지와 소통은 못 하고 단절된 아쉬움에 발걸음을 돌립니다.
동네를 벗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얇고 길고 또는 넓은 길입니다. 우두커니 있으니 바람에 날린 비닐 한 장이 발에 감겼습니다. 지나 올 땐 몰랐는데, 길 곳곳에 암초처럼 숨어 있나 봅니다. 이렇게 비닐은 장벽이고, 단절이고, 상처가 되나 봅니다. 많은 사람이 간절히 소통을 대화를 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비닐은 얼굴만 바꿔 우리를 계속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빗소리
빗소리
 안전장치
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