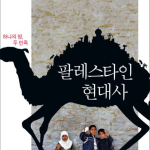예술과 문화를 통해 팔레스타인인을 인간으로 바라본다

서울에서 열린 <해방을 꿈꾸는 시네클럽> 상영회에서 영화 '와지브'가 상영되던 날, 관객들은 아버지의 고집에 웃고, 아들의 빈정거림에 한숨을 쉬었으며,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다툼에 얼굴을 찡그렸다. 안네마리 자키르 감독의 2017년 드라마 '와지브'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사렛 지역을 돌며 결혼 청첩장을 직접 전달하는 여정을 그린다. 농담과 다툼, 그리고 침묵이 오가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가족의 삶이 깊고도 인간적으로 펼쳐진다. 그 순간만큼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웃고 사랑하고 실수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해방을 꿈꾸는 시네클럽>의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양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인디 영화, 단편, 다큐멘터리, 장편까지. 잘 만든 작품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고릅니다."
그 활동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미셸 클레피 감독의 '세 개의 보석 이야기'(1995)였다. 자유를 꿈꾸는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영작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이고, 시적이고, 삶을 보여주거든요."
영화는 연대의 문을 연다
<해방을 꿈꾸는 시네클럽>은 2023년 말부터 격월로 상영회를 열고 있으며, 모든 수익을 가자 주민을 돕는 구호 단체 'Pal.Gaza'에 기부한다. 그러나 상영회의 의미가 모금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앞서 말한 활동가는 설명한다.
"영화 상영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시위는 활동가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비해, 영화를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문화 작품을 통해 팔레스타인인을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문학 연구자 수잔 킨(2007)은 이야기가 독자에게 '공감적 동일시'를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고, 사회인지 연구(도델-페더 & 타미르, 2018)에서는 문화적 서사가 단순한 보도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점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구 언론의 헤드라인은 자주 인과관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팔레스타인인, 폭격으로 사망' 같은 표현은 가해자의 존재를 지우고, 피해자를 통계로만 남게 만든다. 이에 반해 예술은 그 빈자리를 채운다. 이름과 부엌, 유머와 음악을 다시 불러내며, 숫자로 축소된 삶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전통은 곧 저항
팔레스타인 문화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저항이다. 팔레스타인인의 스카프인 쿠피예는 땅과 소속감을 상징한다. 올리브 오일과 자아타르(zaatar)는 세대를 잇는 아침 식탁의 기억이며, 타트리즈(tatreez) 자수에는 팔레스타인인의 연속성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큐레이터 레이첼 데드먼은 타트리즈 자수 문양이 계절과 공동체를 기억하는 방식임을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의 점령 아래에서 이러한 문양은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증언이 되었다.
동시대 미술도 마찬가지다. 니심 갈(2024)은 팔레스타인 예술가들이 검문소와 장벽의 콘크리트를 비판의 도구로 전환해, 이스라엘의 통제 시스템에 균열을 낸다고 썼다. 사헤르 미아리의 설치미술은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조차도 부서질 수 있는 취약성을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회 중에 발언하는 필자 유스라
문학, 지워짐에 맞서는 언어
"디아스포라 상태로 산다는 건 학살이 문 앞에 닥쳤는데, 집에 없어서 마주할 수 없는 것…디아스포라 상태로 산다는 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해당하는 것."— YAFFA AS, 『블러드 오렌지Blood Orange』
문학 연구자 바버라 할로우는 『저항문학』(1987)에서 '식민지 상황에서 문학은 결코 단순한 문학이 아니다. 그것은 투쟁의 장이자 지워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문학 역시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인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가산 카나파니의 소설 '태양 속의 사람들'(1962)은 "왜 탱크 벽을 두드리지 않았는가?"라는 울림으로 끝난다. 침묵과 질식, 외면에 대한 절규다. 에드워드 사이드와 장 모르의 '마지막 하늘 이후'(1986)는 타인의 렌즈에 갇힌 팔레스타인의 긴장을 기록했고, 마흐무드 다르위시는 "이 땅에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구절로 인내의 언어를 남겼다. 오늘날 레파트 알라리르의 시와 무함마드 엘 쿠르드의 에세이는 일상의 슬픔과 저항을 이어간다.
지워짐에 맞서는 문화
문화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왜곡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서구 영화 산업은 오랫동안 아랍과 무슬림을 위협으로 묘사해왔고, 할리우드의 군국주의 서사는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에 비해 <해방을 꿈꾸는 시네클럽> 같은 문화 활동은 인간의 서사를 회복하는 해독제가 된다.
음악도 그 역할을 한다. 모하메드 아사프(Mohammed Assaf)의 노래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다(Dammi Falastini)'라는 자부심을, 세인트 레반트(Saint Levant)의 '데이라(Deira)'는 유산과 기억을, 여러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노래 '라지인(Rajieen.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은 귀환의 약속을 노래한다.
이러한 문화 작품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집단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창고와도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팔레스타인인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대한다는 것은 단지 감상적인 일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는 행동이기도 하다. '불쌍한 희생자' 또는 '부수적 피해'로 축소하려는 경향에 맞서는 것이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 가운데는 무슬림뿐 아니라 기독교인도 있다는 것, 그들 또한 다양한 피부색과 머릿결, 사투리와 전통을 가진 존재임을 일깨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간으로서의 팔레스타인인을 느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다른 나라 음식을 배우듯 올리브 오일과 자아타르로 요리를 해보라. 이태원의 '페트라Petra' 같은 레반트 레스토랑에서 후무스와 팔라펠을 맛보라. 그리고 '와지브', '세 개의 보석 이야기', '파르하', '200미터', '오마르' 같은 영화를 보라.
문화는 곧 존재의 증언이다. 이스라엘의 봉쇄 속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 팔레스타인인을 바라보는 일은, 그들이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역사의 무게를 지니고 있고, 미래를 향한 권리를 담고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팔레스타인인은 단지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팔레스타인, 2023년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 2023년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가로막는 장벽들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가로막는 장벽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