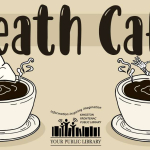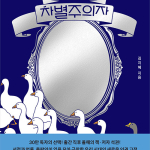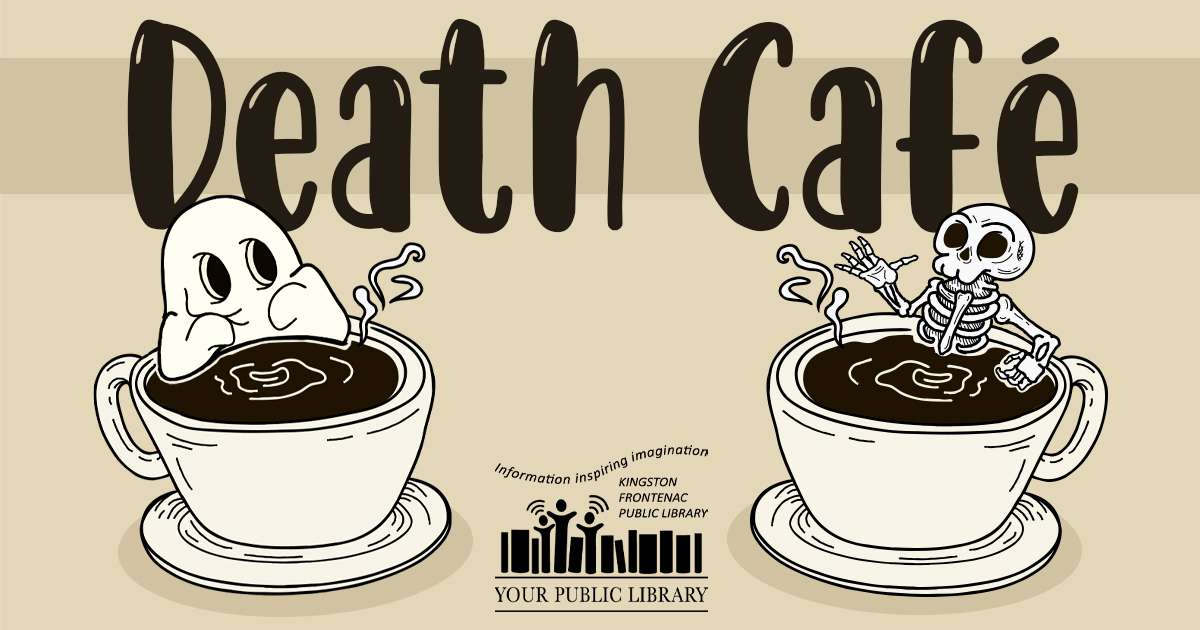
지난 3월, Death Cafe를 열었다. Death Cafe는 2004년 스위스 사회학자 베르나르 크레타즈가 'cafe mortel'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다. 영국 웹 개발자 존 언더우드가 크레타즈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2011년 런던에서 Death Cafe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Death Cafe는 차와 케이크를 함께 하며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임이다.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공간에서 죽음 이야기를 한다.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죽음을 품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들은 불안과 우울, 관계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죽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두려움은 무거운 무게감만이 아닌 삶과 맞닿은 선명한 빛으로 드러났다.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필명 '하제'는 순우리말로 '내일'이라는 의미가 있다.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 만난 이름이다. 언젠가부터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쩌면 내게 다가온 Death Cafe는 내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Death Cafe 첫 모임은 긴장감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어졌다. 누군가 마음에 품고 있던 죽음 이야기를 꺼냈고,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눈물이 고이고, 숨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순간, 마음이 열리고 서로가 연결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던 죽음이 언어화되며, 삶의 감각을 깨웠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 삶의 본질이 다시 보인다"라고 말한다. Death Cafe에서 사람들은 몸소 경험했다. "죽음 이야기를 나누며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거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말하다 보니 감정과 생각이 정리되었다"라고도 했다.
죽음 이야기는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죽음은 어디에나 있구나. 내 곁에 선 사람이 자살 유가족일 수도 있겠다. 그들은 약하지 않았다.", "나의 신체적·정신적 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겠다." 등 Death Cafe에서 경험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적 성찰로 확장되었다. Death Cafe에서 사람들은 삶을 재발견했다. "평소 잘 생각하지 않던 죽음에 대해 반추하며, 일상을 감사하게 느끼고 삶의 속도를 조금 낮출 수 있었다."라고 했다.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면서 삶이 명료해졌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게 되었다. 죽음은 삶의 거울이자, 길잡이였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내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살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가고 싶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삶의 방향과 속도를 조율하는 힘을 쓰기도 했다.
폴 칼라니티는 『바람이 숨결 될 때』에서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은 더 깊어진다."라고 했다. Death Cafe에서 우리는 그 깊이를 경험했다. 눈물과 침묵, 부드러운 웃음 속에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환히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나 또한 묻는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Death Cafe는 죽음을 이야기하며 삶을 배우는 자리다. 참여자들의 솔직한 고백과 공유는 두려움을 넘어 공동체적 성찰을 만들어냈다. 삶과 죽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고 의미 있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는 '숨결'이 흐르고 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사랑
그리스인 조르바의 사랑
 엄마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