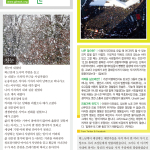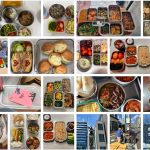노래가 시대를 읽는 것일까? 시대가 노래를 찾아내는 것일까?
1997년에 발표한 델리스파이스의 '챠우챠우'라는 노래를 제목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거의 노래의 전부라 그것을 제목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가사의 전부를 첨부해도 한 줄이면 가능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 보려 하는데도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 보려 하는데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세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록 음악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돈된 기타 연주와 보컬의 고음을 내세운 LA메탈, 반복되는 저음의 리프와 목을 긁는 듯한 노래의 트래시메탈이 양분하던 시대에 3~4개의 코드만 대충 코드만 치고 알아듣기 어려운 가사로 노래하는 록 음악이 등장한 것이다. 마치 '우리는 훈련되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는 듯한 음악.
그 음악을 [얼터네이티브락]이라는 장르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으로는 너바나, R.E.M, 펄잼 등이 있다.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닿았고 신촌의 락클럽에도 다양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델리스파이스의 이 노래도 락음악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감성의 커튼을 젖히고 하나씩 뜯어보면 연주나 노래 사운드 등 여러모로 갖춘 것이 없는 음악이지만 그 시대를 하나의 노래로 소개하자면 이 노래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다.
2016년 즈음부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가 민중가요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7년 발매된 노래니까 그리 젊은 노래도 아니다. 그런데 왜 그 노래가 2030 세대에 의해 운동의 노래로 소환되었을까?
노래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노래가 억지로 그것을 담으려 하지 않아도 그 시대를 사는 이들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만난 세계' 역시 시대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기보다는 희망적인 가사와 따라 부르기 좋은 멜로디, 무엇보다 2030 여성 세대들의 노래라는 점에서 민중가요가 되기에 충분한 요소가 있지 않았나 싶다. 전투적이고 공감되지 않는 멜로디와 리듬의 민중가요의 틀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33세까지 듣던 음악을 평생 듣게 된다는 '33세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그들도 신곡을 듣지만 신곡도 33세 전의 감성이 건드려져야 듣게 되는 것이다.
1997년, 세기말이 다가오고 경제 상황이 가혹해지던 그 시대.
[얼터네이티브락]은 시대를 거부하고 있었다.
2007년을 소녀 소년으로 보낸 세대가 촛불에 그 노래를 소환한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몽환적인 사운드에 의미 없이 맴도는 가사의 그 노래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세대들은 지금 꼰대 소리를 듣고 있다.
노래가 가진 감성의 커튼을 이미 젖혀 버렸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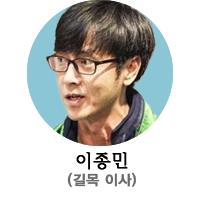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생각
 내란 후 대통령 선거를 지나며
내란 후 대통령 선거를 지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