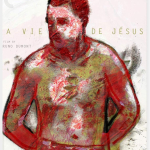내가 봉준호 감독을 ‘별로’로 생각하는 이유
- <미키 17>의 순수성을 접하고

내가 봉준호 감독을 애정했던 것을 2003년 <살인의 추억>까지였다. 소시민적 이기심과 비굴함을 담은 <플란다스의 개>와 시대적 어둠과 야만성을 담아낸 <살인의 추억>은 영화에 대한 열정과 특유의 블랙 코미디가 결합된 웰메이드 영화였다.
그후 봉준호는 ‘오락’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맹목적 모성애의 파괴성과 계급적 불평등을 담은 <마더>(2009)를 열외로 한다면 <괴물>(2006), <설국열차>(2013), <옥자>(2017), <기생충>(2019) 그리고 급기야는 순수한 <미키 17>(2025)는 모두 ‘오락’ 영화였다.
아마도 그의 영화에 ‘오락’이라는 개념을 부여한 것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차라리 나는 봉준호가 그냥 할리우드식 순수한 오락영화를 만들었다면 그의 영화적 재능을 상찬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가 오락영화에 굳이 뻔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려고 어설프게 노력한다는 점이다.
<괴물>을 보고 반미 정서와 무책임한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 <설국열차>를 보고 체제 유지를 위한 계급 갈등과 혁명의 한계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사람이 있을까? <옥자>를 보고 나서 다국적 기업의 탐욕이 생명체를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 뼈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기생충>을 보고 구조화된 계급 격차와 공생의 불가능을 새롭게 가슴 깊이 내면화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이들 영화는 언급한 메시지를 다듬어서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영화는 관객에게 그러한 메시지로 무겁게 질문을 던지거나, 가슴과 머리를 뻐근하게 만드는 도전을 하거나, 나 자신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촉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메시지를 영화에 담아냈다는 ‘자족감’을 안겨줄 뿐이다. <괴물>부터 <기생충>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메시지가 관객에게 실질적인 성찰을 이끌어내기보다, “나는 이런 의미 있는 영화를 소비한다”는 지적 허영이나 감독의 자기만족에 그친다.
이제 그는 할리우드에 진출하여 <미키 17>을 만들면서 오락영화의 순수성을 회복했다. 물론 이 영화도 소모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소외라는 나름의 메시지를 담아내려는 봉준호의 냄새가 배어있기는 하지만 장르적 쾌락에 충실해졌다고 할 수가 있다.
솔직히 나는 <미키 17>을 보면서 앞선 다른 영화의 뻔한 사회적 메시지 때문에 느껴지던 불편함을 덜어낼 수가 있었다. 나는 봉준호가 자신의 영화에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야 한다는 386세대의 의무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자족감에 빠진 사회물이 아니라 그냥 ‘오락’ 영화를 만드는 것이 편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영화에서 비로소 봉준호의 내면에 담긴 사회의식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뒤틀린 인간의 내면을 응시하는 탐미주의자 박찬욱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이규성(길목 조합원)

 조안나 호그 감독의 영화들을 보았네
조안나 호그 감독의 영화들을 보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