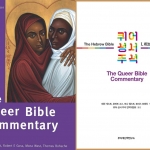인간의 무늬인 종교성에 대한 성찰 36 : 신을 위한 변명
코로나 사태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위기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길어진 비대면 기간에 서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 신앙공동체의 기운이 약해지고 하나님도 자취를 감춘 것 같다. 정말, 신이 사라진 건 아닐까? 늘어가는 고통의 탄식들, 중첩된 절망이 빚어낸 젊은 체념, 욕망의 등고선을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권력과 너그럽게 치장한 자본, 어쩌면 신의 흔적을 당분간 보기 힘들 것 같다.
유신론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인간의 탐욕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문제이지 해답이 아니다. 만일, 이런 사태를 몰고 온 누군가가 신처럼 존재한다면, 온 인류는 힘을 합쳐 그를 처치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인간의 유한한 죄에 대하여 무한한 징벌을 가한 신은 인류 정신사에서 거의 죽었기 때문이다. 문명사에 등장한 수많은 신이 자취를 감춘 까닭은 재배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변혁의 동력에서 멀어져서이다. 신이 소멸하는 이유는 강자들의 욕망을 들어주지 못해서가 아니다. 약자들의 고통에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을 향한 인간의 믿음에 욕망과 오해가 얽히는 것은 비극이다. 따라서, 닥친 불행을 이유로 신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씻는 계기로 삼는 것은 이로운 일이다. 하지만 자기 안에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가 앓고 있을 때 홀로 자유로울 사회적 존재는 없으며, 혼자 초연할 수 있는 종교적 존재 역시 없다. 그래서 신학적 물음도 계속된다.
신은 코로나 사태의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까? 차마 이럴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할까? 그렇다면, 그렇게 전지(全知)하지 못한 신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 알았다면, 의도한 걸까, 의도하지는 않고 용인한 걸까? 하루에도 수만 명씩 쓰러지는 달릿(Dalit)의 고통을 용인하는 신과 동행하는 것은 옳은가? 만일 의도치도 않았고 용인하지도 않았다면, 막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 물음에 이르러서 우리는 종교적 욕망의 마지막 질문을 접하게 된다. 과연 인간은 전능(全能)하지 못한 신을 섬길 수 있을까?
위에 나오는 것들은 신의 ‘지식과 의지와 능력’을 둘러싼 오래된 신학적 물음 가운데 몇 개이다. 이런 신정론적 사유 구조를 명료하게 설계한 라이프니츠 이래로 기독교 신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신론적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신의 선(善)을 줄이면서 전지전능한 신을 옹호하든지, 신의 전지전능을 줄여서 선한 신을 지켜내든지. 보수적인 신학은 주로 전자를 선택하고 개혁적인 신학은 후자를 선택했지만, 현실에서는 개혁적인 정신이 정통의 칼날에 의해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잘려나가곤 한다.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 그런 힘의 신을 앞세운 폭력이 야만의 역사를 쓰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선(善)이 줄어든 폭력적(전지전능한) 신을 거부하여 이단이 된 마르키온(Μαρκίων)과 같은 오래된 운명을 기독교 사상이 벗게 된 계기가 있었다. 유기체적 세계관이 신학에 도입되었을 때이다. 과거의 선택이 ‘선한 신’과 ‘전지전능한 신’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신학적 지형에서의 선택은 ‘불변의 신’과 ‘가변의 신’ 사이에서 벌어졌다.
만일 완벽해서 변하지 않는 신에 의해 세상이 지어졌고, 신이 창조한 그 세상에 불행이 존재한다면, 신은 그 불행을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 없었거나, 막을 수는 있었으나 허용했다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세상의 변화와 함께 변해가는 신에 의해서 세상이 지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 변화 가운데 불행이 존재한다면, 신은 그 불행의 원인으로서 규탄받기보다는 그 불행을 극복해가는 과정의 동반자로 이해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의 가변성(changeability)에 관한 신학적 상상이 가능하게 된 건 기계론적 세계관을 해체한 지성의 모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움에 관한 진화와 창발 이론, 관계성에 기초한 상대성이론, 불확정적 미시세계를 밝힌 양자역학, 유한과 무한의 가변적 관계를 설명한 집합이론과 프랙탈 이론 등에 의해서 변화/진화하는 것은 유한한 세계만이 아니라 무한한 신도 그러하다는 이해가 정착되어갔다. 그 결과, 기독교 신학이 ‘부동의 동자’(the unmoved mover)라는 오래된 관념과 결별하고, 고통과 비참의 세계와 함께한 신에 관한 경전의 증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이 준 선물이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신이 남아있을까? 무신론이란 신의 부재에 관한 논증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속은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은 사태를 의미한다. 이 위기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파괴된 자연과 고통당한 인간에게 더 자비롭게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기를 빈다.
(김희헌, 향린교회 목사)


 김희헌 인문(人紋)의 종교 37 - <퀴어성서주석>을 읽는 재미
김희헌 인문(人紋)의 종교 37 - <퀴어성서주석>을 읽는 재미
 김희헌 인문(人紋)의 종교 35 - 마음의 북소리
김희헌 인문(人紋)의 종교 35 - 마음의 북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