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tfeelslikefilm, 출처 Unsplash
나는 봄이 참 좋다.
매서운 바람을 가르고 은근히 다가오는 봄의 따스한 기운이 참 좋다.
웅크렸던 몸을 펴고 무거운 옷을 벗게 되는 봄이 참 좋다.
꽃을 깨우는 햇빛이 좋다.
그래서 짧디 짧은 그 봄을 기다리곤 했다.
우리집 둘째 민우가 돌 무렵 고열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피검사 수치가 이상하다고 했다.
모든 염증 수치가 이렇게 고열이 날 만큼의 수치가 아니라며
골수검사를 해보자고 했을 때도 나는 믿지 않았다.
그때는 그냥 검사 자체가 무서워서 겁에 질려 벌벌 떨었던 기억밖에 없다.
그렇게 민우는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나는 씩씩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어떤 거센 바람에도 굳세게 서있는 엄마이고 싶었다.
씩씩한 척은 혼자 다하며 세 아이를 돌보고 민우와 투병생활을 했다.
처음 1년은 견딜만했다.
1년간 항암주사를 맞으면 완치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는데.
혈액암이 재발되었다는 말을 들었던 날 밤이 잊히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 세 아이를 재우고 깜깜한 방 안에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몽 같은데, 깰 방법을 모르겠어서 울었다.
모든 게 나에게 차디찬 겨울바람 같았다.
혈액암이 재발하면 골수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민우와 쌍둥이인 지우의 골수가 민우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던, 이상했던 그날도 참 잔인한 날이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상한 날이었다.
민우를 업고 병실 복도를 돌며 내가 민우한테 말했다.
"민우야, 우리 민우의 피를 만드는 골수가 많이 아파."
민우는 등에서 알아듣는 듯 대답을 했다.
"으!!!"
"그래서 건강한 피를 받아야 하는데, 지우가 민우오빠한테 건강한 피를 나눠준대.
민우는, 지우야 고마워, 하고 받으면 돼."
민우는 알겠다는 듯이 정말 대답을 했다.
"으!"
"만약에 지우가 아팠어도 민우가 나눠줬을 거야. 그치?"
"으!"
가슴이 미어졌다.
두 살 된 두 아이를 침대에 뉘어야 했다.
그렇게 지우의 골수를 어렵게 이식받았지만,
민우의 혈액암은 또 재발을 했다.
병실에서 꺼이꺼이 울던 나를 말도 못 하는 아기 민우가 다가와 가만히 안아주었다.
못난 엄마였다.
다시 긴 입원에 들어갔다.
항암을 하고 그게 잘 되면 2차 골수이식을 한다고 했다.
그때도 나는 겨울 속에 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얼른 나아 집에 가자는 말을 달고 살았다.
병원은 겨울이고, 집은 봄이었다.
투병은 겨울이고, 건강은 봄이었다.
민우와 함께 집에 가고 싶었다.
온 가족이 모여 평화롭게 지내는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생각해 보면 그때 나는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민우랑 하루하루 기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었다.
붕붕카도 가져가 태우며 까르르 웃는 민우와 병원복도에서 낮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건 생각일 뿐.
솔직히 마음은 병원이 지겨웠다.
얼른 나아 집에 가기만을 너무 간절히 기다렸다.
그리고 민우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모든 게 후회스러웠다.
민우가 떠나고 나니,
민우와 함께 지냈던 모든 날들이 봄이었음을 알았다.
청천벽력 속에 울던 밤도,
독한 항암제를 맞는 민우를 보기만 해도 가슴 아팠던 수많은 날들도...
모두가. 봄이었다.
돌아보니 상담을 받는 내 태도도 그랬던 것 같다.
아프고, 쓰리고, 화나고, 눈물 나고, 뒤집어지고, 또 아프고, 더 아픈.
내 고통을 만나면서
솔직히 나는 차디찬 겨울바람 같은 이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던 것 같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담은 그런 게 아니었다.
오히려 고통을 끌어안는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상담선생님 앞에서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했던 날도,
힘든 꿈을 꾸고 이야기했던 날도,
아무 느낌도 못 느끼고 쏟아냈던 날도,
잃어버린 것이 슬퍼서 울던 날도,
모두 봄이었다.
정신분석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과정이라는 말이 오늘 새롭게 와닿는다.
나도 누군가의 옆에 앉아
수많은 '고통의 봄날'을 함께 보내고 싶다.
우리 모두는 그런 단 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일곱 살 아이도 상담실에 와서 놀이를 통해 나에게 묻는다.
"선생님, 정말 제 고통에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30대 어른도 상담실에 와서 여러 가지 말로 노크한다.
"선생님은 정말 내 고통과 함께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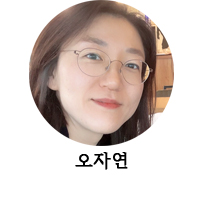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